Vol. 28
SPECIAL[소설가 박생강의 금요북클럽] 5월의 도서 《센서티브》

금요북클럽 5월의 도서
《센서티브》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섬세한 심리학
박생강
소설가, 수사전문지 《수사연구》 기자
![]() <소설가 박생강의 금요북클럽>은
<소설가 박생강의 금요북클럽>은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꼭 읽고 싶은 분들,
책을 읽은 후 생각을 나누고 싶은 분들,
책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서울책보고의 공식 독서모임 <금요북클럽>의 주제 도서 이야기로 매 호 독자들을 만나러 옵니다.
<금요북클럽>이 모이는 날은 매달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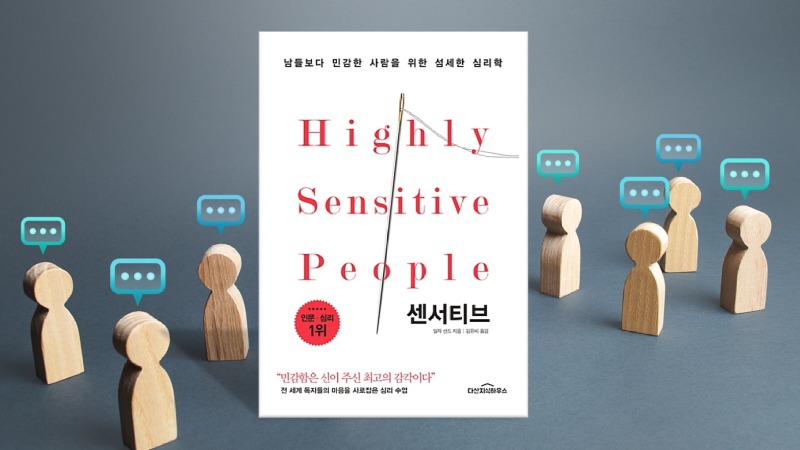
▶ 《센서티브》, 일자 샌드, 김유미 옮김, 다산지식하우스 @서적백화점_7,000원
금요북클럽의 5월의 도서는 일자 샌드의 《센서티브》였습니다. 이 책은 남들보다 민감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 처방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휴식을 취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대신 현실을 직시하는 훈련을 하라는 등 센서티브한 성격의 사람들을 위한 지침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 책이 좀 다르게 읽혔습니다. 민감한 성격의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둔감한 사람이 민감한 성격의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 놓은 책이라는 느낌이랄까.
아무래도 저는 글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 민감한 성격의 지인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시절은 물론 그 이후 직장생활과 작가 생활을 병행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잡다한 상상을 많이 하는 망상형 인간에 가까운 편이지 민감한 유형의 성격은 아닌 듯했습니다(작가치고는 좀 둔한 편?). 물론 저도 젊은 시절 가끔 대인관계에서 공황장애 비슷한 공포를 느끼기도 했지만, 그건 민감함과는 약간 다른 영역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지만) 그냥 사람이 싫거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약간 이런 냉소주의자로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여간에 《센서티브》를 읽다 보니 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의 모습이 스쳐 갔습니다. 학창 시절 민감한 성격의 지인들은 예민한 만큼 세상을 깊이 있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처도 쉽게 받았지요. 많이 아파하고, 많이 슬퍼하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또 그 상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 꾹꾹 참기도 했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 감정들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위로를 잘해주었나? 위로는 저의 언어가 아니어서, 조금 그들에게 미안하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절에 민감한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센서티브》를 읽으면서 다시 곱씹어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싶더군요. 젊은 시절 저는 팩폭 계열이어서 말의 폭탄을 재잘재잘 쏘아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의 한마디 말이 타인의 가슴에 비수가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곱씹어 보면 말이란 것은 참 애매합니다. 똑바로 직선으로 말해도 곡선으로 꼬이거나 아예 내 의도와는 다른 식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던진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나는 멋도 모르고 뒤돌아서 제 갈 길을 가는 상황이랄까요? 그때 뒤통수를 향해 다시 들려오는 말이란, 그 인간, 그거……

▶ 민감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깊이 있게 보는 눈이 있지만 상처를 잘 받아서 많이 힘들어하기도 한다.
사실 학창 시절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말의 전달이란 상당히 복잡합니다. 최근에 저는 직장생활에서 중간자의 위치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고용주를 만났는데, 그 고용주와 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자세히 말하기는 그렇지만 요약하자면 새로운 사람과 일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만, 아는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것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인 천하>의 정난정도 아닌데 제가 중간에서 오가며 양쪽 말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심플하게 내 의사만 전달하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아니면 기자로서 취재를 하러 가서 인터뷰할 때처럼 상대방의 말에 리액션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편하게 속말을 꺼낼 수 있게 하는 기술과도 달랐습니다.

▶ <여인천하>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SBS에서 방영한 사극이다. <야인시대>와 함께 SBS를 대표하는 대하드라마로서
극 중 정난정(사진 좌측 인물, 강수연)은 남편인 윤원형과 문정왕후 사이를 오가며 당시 권력 싸움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 SBS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그 뜻만 전달해야 하는 노고가 있었습니다. 뭔가 양쪽을 오가는 전달의 연금술사 같은 기술을 발휘해 보고자 했지만, 항상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간 알지 못했던 한마디 말에 담긴 민감한 감정들에 대해서 곱씹어 보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내가 이해한 바를 백 퍼센트 전달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나와 백 퍼센트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렇기에 상대방이 이해 가능한 중간의 어느 지점을 미묘하게 찾아내야 한다. 그게 쉬울까요? 그게 쉬웠다면 저는 글 쓰는 생활을 그만두고 로비스트로 이직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현재는 오피스 빅뱅의 시대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대면보다 비대면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고 더 늘어날 것입니다. 나의 비대면 거래처 직원이 알고 보니 챗GPT? 이럴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하여간에 이제는 문자메시지가 소통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자의 소통은 말의 소통보다 쉬울까요? 이모티콘 하나로 친절함을 어필할 수 있을 테니? 하지만 아시잖아요. 네와 네네 라는 카톡 메시지 사이에서도 감정이 어떻게 다른지 고민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의사소통에 센서티브한 언어의 노예. 그러니 오피스 빅뱅의 시대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관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손절이 좀 더 쉬워질 거라는 건데 그게 과연 다행인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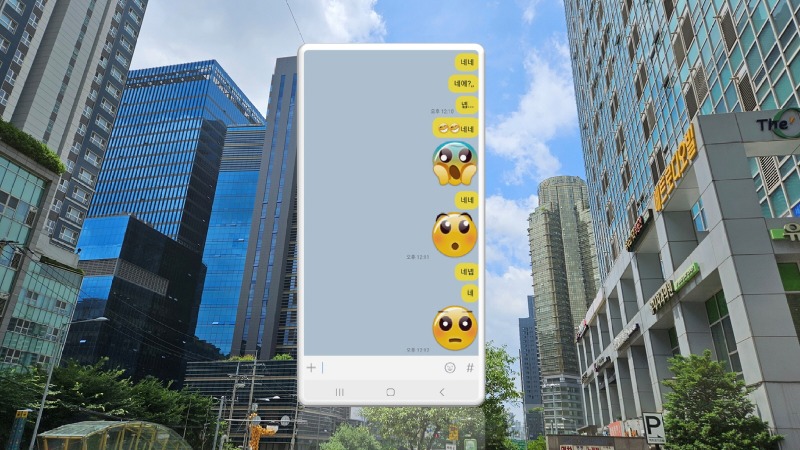
▶문자의 소통은 말의 소통보다 쉬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생강

박생강
소설가, 수사전문지 《수사연구》 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 《수상한 식모들》로 제11회 문학동네소설상을 받으면 등단했으며
2017년 《우리 사우나는 JTBC 안 봐요》로 제13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 《에어비앤비의 청소부》, 《나의 아메리카 생존기》, 《빙고선비》등을 펴냈다.
서울책보고 뉴스레터 구독신청에 관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메일링 서비스 제공
- 수집 및 이용 항목 필수 항목 : 이메일, IP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보유기간 : 2년 이내(수신거부 시 즉시 파기)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 정보 중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기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구독취소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구독취소 방법 : 구독 신청 하신 이메일로
"구독해지 합니다." 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주세요.
- 보내실 메일 주소 : hans@bmco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