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01
BOOK&LIFE[SIDE A] 헌책방의 숨은 매력

헌책방의 숨은 매력
윤성근
이상한나라의헌책방 대표
책은 매력적인 물건이다. 책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이다. 지구상의 다른 동물은 책을 만들거나 읽지 않는다. 그들도 나름대로 문화라는 걸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처럼 그걸 기록하거나, 쌓거나, 분류하지 않는다. 그런 행위는 인간이 가진 특권이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책이 해로운 물건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공원 벤치나 카페에서 책 읽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면 아름답다고 느낀다.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란 단지 외모에서 비롯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책 읽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건 경험에 의한 심리적 반응이다.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이의 내면이 아름다울 것이라고 짐작한다. 심지어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책을 옆구리에 끼고 있는 장면을 보면, 별 이유 없이 그를 매력적으로 느끼기도 한다.

이렇듯 책의 매력이란, 정확히 어떤 것 때문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기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그뿐만 아니라 책의 종류, 책의 크기, 책의 냄새, 책의 질감까지 예로 들기 시작하면 책의 매력을 말하기 위해 또 다른 책 한 권을 써야 할 정도로 분량이 넘칠 것이다.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책의 매력, 우주같이 넓은 책의 세계에 대해서!
책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우선은 이렇게 시작하자. 책은 새책과 헌책이 있다. 새책은 인쇄소에서 나와 서점에 전시된, 아직 아무도 사지 않은 책이다. 오늘 세상에 처음 선보인 책도 새책이고 10년 전에 출간됐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책 역시 새책이다. 그리고 헌책은 중고책이다. 원래는 새책이었지만 누군가 사서 읽고 헌책방에 내놓아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책이다. 그러나 헌책은 이름 그대로 ‘헐어있는 책’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선 책에 이런저런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새책만큼 깨끗한 책도 헌책방에서 다루게 되면 헌책이라고 부른다. 오늘은 헌책과 헌책방의 매력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자.
어떤 사람들은 헌책이 원래 다른 사람의 책이었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에 헌책은 독특한 매력을 품고 있다. 헌책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매력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중고상품이기 때문이다. 헌책방에서 팔리는 책들 가격은 대개 새책의 30~60% 선이다. 새책 한 권 살 수 있는 돈으로 헌책 두세 권을 살 수 있으니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이보다 큰 매력이 있을까?
그러나 헌책이 꼭 싸다는 이유만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헌책방을 찾는 사람은 아직 하수다. 중수, 고수로 가기 위해선 책의 세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헌책의 첫 번째 매력이 저렴한 가격이면, 헌책방을 찾는 매력 중 으뜸은 절판된 책을 만나는 기쁨일 것이다. 책은 한번 출판되고 나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다. 출판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 팔리지 않는 책을 계속 서점에 내보낼 수는 없다. 또한, 저작권 문제 등으로 더는 판매하지 못하는 책도 많다. 이런 책들을 헌책방에 가면 살 수 있다. 물론 모든 절판본들이 헌책방에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자주 가게에 와서 살펴야 한다. 조금 수고로운 일이지만, 그 덕분에 나는 1992년에 번역된 에밀 시오랑의 <세상을 어둡게 보는 법>을 출간되고 20년이나 지난 후 헌책방에서 만났고, ‘뿌리깊은 나무’ 잡지와 거기서 펴낸 단행본 ‘민중 자서전’시리즈 중 몇 권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새책을 파는 서점에선 살 수 없다.
절판되지 않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러 구판을 사기 위해 헌책방에 가는 일도 있다. 새책보다 가격이 저렴하기에 구판을 찾는 게 아니다. 구판에만 들어있는 특별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반 일리치의 <그림자 노동>은 지금도 새책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은 1988년에 역사학자 박홍규의 번역으로 분도출판사에서 출간된 일이 있다. 같은 책이지만 분도출판사판에는 본문 뒤에 부록으로 더글라스 러미스와 이반 일리치의 대담이 번역되어 실렸다. 더글라스 러미스는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학자인데 일본에서 활동하던 중 이반 일리치의 방문을 계기로 만남이 이뤄졌다. 이 대담은 1988년도 판에서만 읽을 수 있으니 <그림자 노동> 구판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얼마 전에는 철학자 하이데거의 명저 <숲길>이 다시 출판됐다. 나는 이 책을 좋아해서 구판으로 이미 가지고 있지만, 신판도 샀다. 두 책 모두 신상희 교수의 번역으로 사실상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판을 보니 구판에 있던 ‘옮긴이 해제’ 부분이 빠졌다. 옮긴이가 쓴 글에 관심이 없는 독자라면 그만큼 책 무게가 줄었으니 신판이 좋다. 하지만 이걸 읽고 싶은 독자라면 해제 부분만 따로 사거나 헌책방에서 해제가 포함된 구판을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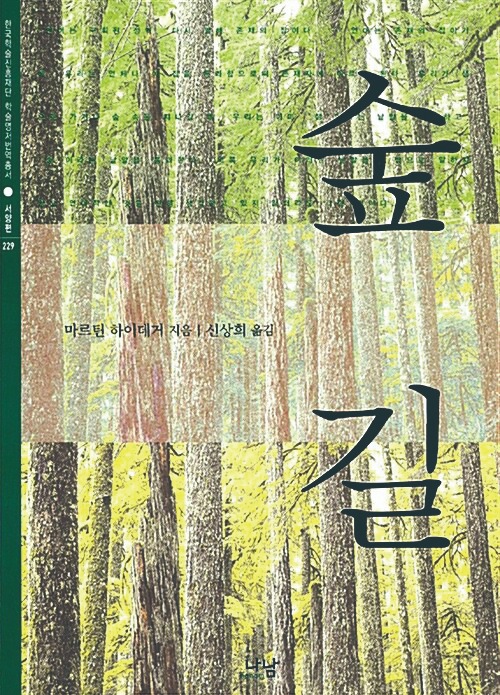
▶ (왼쪽) 박홍규 번역 <그림자 노동>, (노른쪽) <숲길> 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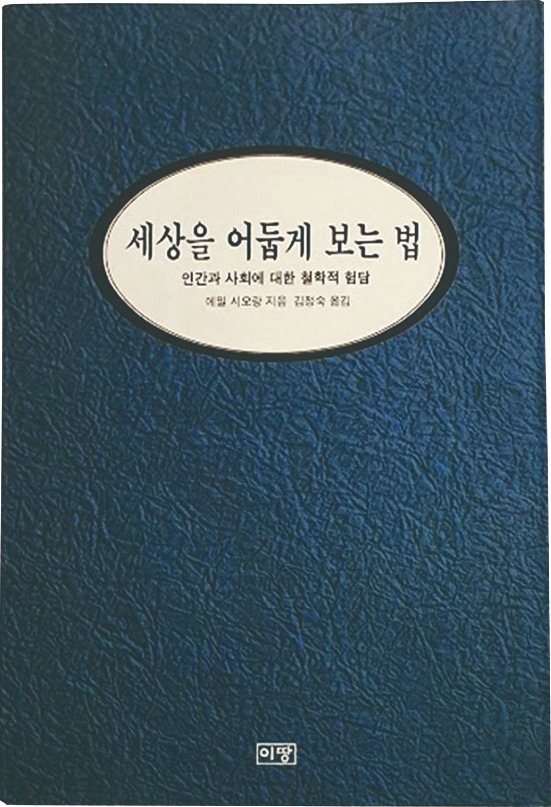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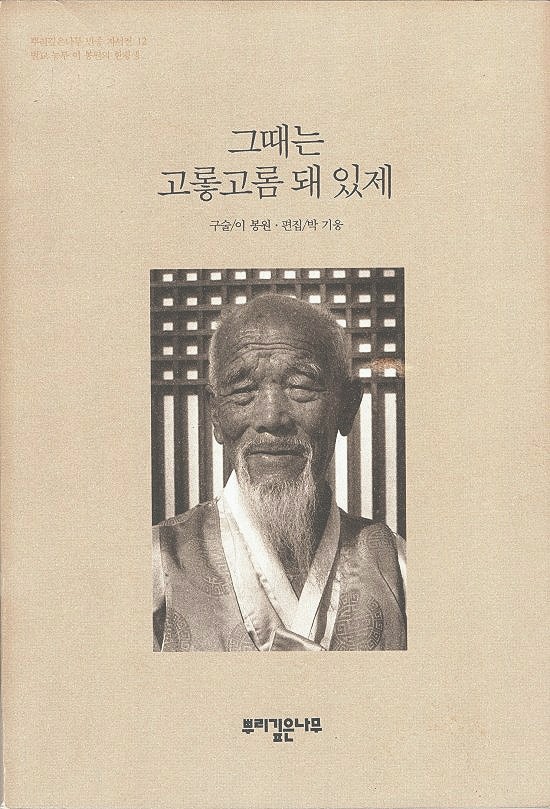
▶ (왼쪽) 에밀 시오랑 <세상을 어둡게 보는 법>, (오른쪽) 뿌리깊은 나무에서 펴낸 <민중 자서전>시리즈 중 한 권
예를 몇 가지 들었지만, 헌책과 헌책방이 가지는 매력이란 정말 무궁무진하다. 나는 내가 느끼는 매력을 몇 자 두서없이 적었을 뿐이다. 누군가는 또 다른 매력에 빠져 지금도 헌책방을 탐험하고 있을 것이다. 헌책방은 그야말로 책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그 안에서 어떤 매력을 찾을지는 전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작은 헌책방은 작은 곳 나름으로, 큰 곳은 또 그만의 매력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잠실나루역 근처에 있는 ‘서울책보고’는 이제 개관 2주년이 된 멋진 공간이다.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는 헌책방들을 모두 둘러보기 힘들다면 이곳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다. 헌책방이 책의 백화점이라면 서울책보고는 그 백화점의 정수를 모은 ‘헌책방 아케이드’라고 부를 만하다.

요즘엔 도시 곳곳 자투리땅에 공원을 만들어 삭막한 회색 풍경을 아름답게 바꾸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길을 걷다 가끔 이런 풍경을 만나면 마음까지 녹색으로 물드는 듯 편안해진다. 나는 도시에 헌책방들이 많아지면 이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는다. 걷다가 문득 아무 이유도 없이 가까운 헌책방에 들어가 책을 구경하고, 거기서 뜻하지 않은 멋진 책과 만나 하루가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상상해보라.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까 싶다.
책과 사람이 함께 있는 풍경은 아름답다. 특히 오래된 헌책이라면 더 좋다. 그 매력을 알고 즐기는 사람이 새싹 돋듯 여기저기 많아지면, 세상은 봄을 맞이한 들판처럼 싱그러운 꽃들로 가득해 향기로울 것이다.
윤성근
에세이스트, 이상한나라의헌책방 대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한동안 IT회사에서 일했지만
책이 좋아 회사를 그만두고 헌책방에 취직했다.
2007년에는 독립해 '이상한나라의헌책방'을 만들었고 현재까지 거기서 일하고 있다.
책읽고 글 쓰는 것 말고는 딱히 재주가 없어서 책 몇 권 펴낸 것 말고는 딱히 자랑한 만한 게 없다.
헌책방에서 일해 번 돈으로 또 책을 사러 다니는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서울책보고 뉴스레터 구독신청에 관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메일링 서비스 제공
- 수집 및 이용 항목 필수 항목 : 이메일, IP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보유기간 : 2년 이내(수신거부 시 즉시 파기)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 정보 중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기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구독취소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구독취소 방법 : 구독 신청 하신 이메일로
"구독해지 합니다." 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주세요.
- 보내실 메일 주소 : hans@bmcom.kr


